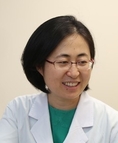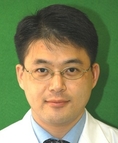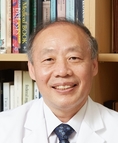존 던(John Danne)
존 던(John Danne)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갑(岬)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며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영지(領地)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위 글은 영국 성공회 사제인 존 던(John Donne, 1572-1631)의 기도문(Meditation 17,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에서 발췌한 것으로 동명의 소설을 쓴 헤밍웨이를 비롯하여 많은 이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시어의 해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내게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너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단절된 너 또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각각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형성할 수 있을까? 혈연은 근원적인 인연일 것이다. 지역, 국적 등 사람을 함께 묶어주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서로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는 각자 맡은 소임인 직업으로서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치과의사라는 의료인으로서 우리에 참여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일은 내가 느끼기에는 추리소설 속의 탐정과 비슷한 것 같다. 단서를 수집해서 추측을 하고, 추측을 기반으로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증거를 찾아 가설을 검증한다. 속성상 외과의로 분류되는 치과의사는, 검증된 가설을 영장처럼 챙겨 들고 범인을 잡아내는 일까지 하게 된다.
환자의 통증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고, 환자가 왜 그 부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본다. 의료인들을 이 과정을 전문적인 용어로 ‘주소’ 청취라고 부른다.
의료를 포함해서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은 환자들이 본인의 문제를 아예 진단해서 오기도 한다. 환자 스스로 느끼기에 앞니에 충치가 있는 것 같다 거나, 사랑니가 부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데에는 환자 나름에는 이유가 있다.
단 그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고, 잘못된 짐작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두 번 세 번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다 보면, 환자의 진술이 처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띄기도 한다.
환자의 언어를 의학적 용어로 바꾸는 과정은 번역에 가깝다. 좋은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원 텍스트의 언어를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치과의사에게도 같은 소양이 필요한 것 같다. 환자의 연령, 이전의 경험, 치료이력 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해당 증상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환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야 환자의 언어를 손실 없이 의학적 용어로 바꾸어,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
그렇기에 몇 번 만나 환자의 몸과 언어에 익숙할수록 더 금방 파악할 수 있다. 크고 화려한 병원들이 있음에도 동네에 있는 단골 의원을 찾는 환자분도 이 이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환자의 주소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데에만 이만큼의 노력이 들어간다. 환자의 진술과 실제 육안 진찰 시의 증상(sign)의 차이, 또 진단방사선촬영을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 진술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의료인의 진단은 매우 정교하고 중요한 과정이다.
최근에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달콤한 결실을 맺은 사업체들은 이제 의료분야에까지 그 손길을 뻗치고 있는 요즘이다. 전면에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취약 지역 지원’이다. 그 목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타당한가?
우리나라는 의료의 많은 영역이 급여화 되어 국가가 통제하는 급여수가 제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의료인이 국민에게 행한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경제 논리로 검열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의문은 미뤄둔다. 급여수가는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비급여수가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원내에 게시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미 자신이 지내는 지역의 비급여수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를 망라하여 특정 플랫폼에 전달하고 플랫폼에서 의료 알선을 중재하도록 조장하는 일이 과연 ‘누구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사기업의 마케팅을 위한 ‘알 권리’에 국민의 의료권과 개인정보가 희생당하는 것을 국가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한국의 상황은 아프리카나 호주 대륙과는 다르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인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많으며 의료수가도 미국 유럽 등의 OECD 국가의 1/10 이하로 국민부담이 크게 낮은 곳이 대한민국이다. 의료기관이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을이라면 사실상 인구가 1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다.
나의 부모님도 비슷한 농촌에 살고 계시며,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내로 나가셔야 한다. 내 눈에 복잡해 보이는 다양한 농기계도 척척 다루시고 시내까지 운전해 나가는 것도 능숙하신 아버님이지만, 스마트기기에 관해서는 알람 설정을 바꾸는 일도 곤혹스러워하신다.
이런 분들이 스마트기기와 연동된 의료진단 플랫폼을 과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환자 언어 통역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플랫폼의 효용성이 더 미심쩍다. 과연 적절하고 안전한 의료 지원이 가능할까?
직접 운전해서 시내에 가시는 것보다 불편할 것이다. 그에 반해 오류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위험해질 우려는 훨씬 커진다. 취약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결국 플랫폼은 오로지 플랫폼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 것일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다. 우리 국민건강과 국가의료시스템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지금 경종이 울리고 있다.
* 외부 컬럼과 기고는 메디포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